
|
| ▲ 용재 오닐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잘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려면 부모에게서 좋은 사랑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
|
고통스런 삶 이겨내려면 부모에게서 좋은 사랑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필자의 직업 중에는 한국의 여러 정신 건강 센터들과 자문을 하는 역할이 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 컨설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여러가지 문화나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곤란을 겪을 때도 많다. 특히 한국의 아동 센터와 일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다.
한국에서도 요즘 복지제도가 많이 발달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방임과 무관심 속에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영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아동들은 영국에서는 구청에서 아동 보호법을 발동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하여 위탁이나 입양시키는 방법을 택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접근이 문화적으로 아직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 같다. 대신에 일종의 집단 위탁 처럼 저녁에 소위 ‘공부방’이라는 곳으로 보내져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니면 할머니가 힘드셔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 밥도 먹고 숙제도 하고 또는 심리치료를 받고 밤에는 집으로 돌려 보내진다.
필자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안되었는데 항상 머리속에 맴도는 질문이 ‘왜 애들에게 엄마를 돌려주지 않고 치료나 공부를 시키는 걸까?’라는 것이었다. 즉 그런 돈을 센터를 세우거나 치료비로 사용하지 말고 슈퍼마켓 종사자 처럼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아동들의 엄마들에게 정부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함께 있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요즘 뒤늦게 용재 오닐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다. 외국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 빨리 정보를 입수하지는 못했는데 알고보니 한국에서는 꽤나 알려진 비올라 연주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용재 오닐이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연주하는 ‘섬집 아기’라는 동요를 들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일단 가사 내용이 ‘어머니가 굴을 따러 가서 일하는 동안 애기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자고 그 동안에 엄마는 일하다가 애가 걱정이 되어서 빨리 들어 온다’라는 내용이다.
이런 가사에서 유추해서 보면 어쩌면 애기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기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 같다. 자기를 염려하는 엄마의 마음이 자기에게 닿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면 엄마가 밤에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영향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엄마를 아빠가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거나 또한 그러한 갈등에 대한 불안을 엄마가 자신의 갈등 때문에 잘 헤아려 주고 다독거려 줄수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리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엄마가 애들을 혼자 집에 두느냐 아니냐는 단순한 관점에서 부모역할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아동을 혼자 집에 둘 수 없다고 해서 부모가 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부모가 인터넷 게임만 한다거나 부부싸움만 한다면 오히려 집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마음속으로 애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화 한통화 중간에 줄 수 있는 부모보다 훨씬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문화를 사이에 두고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을 단순히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라는 비난은 자칫 엉뚱한 곳으로 흐를 위험성이 많다. 최근에 한국 미디어에서는 주로 이런 마녀 사냥이 위주가 되어 있는데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한국은 ‘한’의 문화이다. 엄마가 생업 때문에 굴따러 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삭혀야 되는 ‘한’은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의 정서 깊숙한 곳에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용재 오닐의 삶은 어쩌면 이러한 한국인의 ‘한’이 그대로 투영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문화학자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의 역사는 여러가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즉 여러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항상 약소국으로 지내 왔고 그 약소국의 비애라는 것이 힘이 없으니까 화가 난다고 표현을 하면 목숨이 위태롭게 때문에 때로는 굴욕도 참아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자연히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정을 많이 억누르게 되고 또한 그 억누른 감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홧병’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일종의 ‘매저키즘’ 같은 생활을 유지한다.
물론 가정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시댁에 헌신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하는 한국의 아주머니들이 ‘매저키즘’ 환자 같이 자신의 고통을 의식적으로 즐긴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희생적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제 삼자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록 고통스런 삶을 지속하는 데에는 분명히 자기 내면의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쩌면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다고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즉각적인 자해 방법 말고도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다른 형태의 ‘자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용재 오닐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한’을 예술로 승화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을 품으면 병이 생기고 자신이나 남을 전혀 도울 줄을 모르는데 이 용재 오닐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잘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려면 부모에게서 좋은 사랑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용재 오닐의 어머니는 지능이 비록 높진 않지만 아기에게 필요한 사랑과 아기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할머니도 좋은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이야기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따뜻하지 못했다면 자신도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했으리라고 본다.
어쩌면 ‘공부방’에서 필요한 것도 숙제나 치료가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리라. 한국에서는 아직도 모든 것이 ‘공부’로 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름도 ‘공부방’이다. 그렇게 해야 마치 존재가치가 있고 또 학부모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부’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동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 어렸을 때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물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학문을 배워 나갈 수가 있다. ‘호기심’이 없는 아동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 느껴져도 느끼면 안되고 봐도 못본 것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혀 호기심을 가질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또 발달되기도 힘들다.
글쓴이
우 이 혁
wooieehyok@msn.com약력 : 한국 신경정신과 전문의 영국 정신과 전문의 (소아, 청소년, 성인)정신분석 정신치료사현재 NHS 소아 청소년 정신과 컨설턴트영국 왕립 정신 의학회 전문 회원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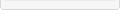





 의견목록 [의견수 : 0]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