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우 병 / 민주 평화통일 자문위원

강산이 변한다는 긴 세월 그리고 또 거듭 두 번이나 해가 바뀌는 지금까지 <코리안위클리>를 애독하였으니 무척이나 긴 인연이기도 하다.
필자가 영국에 정착한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발행되는 한국 언론매체와 손쉽게 구하여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이 얼마나 아쉬었는지 재영 한인회의 회칙 마저도 독일에서 발간하는 <한국일보> 구주판을 이용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다.
열 두해 전 어느 유학생 한 명이 큰 밴을 몰고 필자를 찾아와 인사를 한 일이 있었다. 특이한 인사성에 감동되어 그의 유학생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지내던 어느날 그가 <코리안위클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얼마후 그는 다시 찾아와 학업을 중단하고 언론 사업을 하게 된 사유를 이야기 하며 비교적 일찍 정착한 필자에게 교민의 입장에서 독자 투고를 권유하였다. 필자는 ‘한(恨)이 맺힌 영어’라는 제목의 글을 투고했고 그것이 <코리안위클리>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코리안위클리>보다 먼저 창간했던 박중희씨의 월간지 <런던시보>의 발행이 중단되는 형편에 주간지의 경영난에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듯 <코리안위클리>는 꿋꿋이 유지돼왔으며 후에 발행인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굳건한 뿌리와 굵게 자란 나무로 성장, 이제 어떠한 폭풍에도 견딜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가며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600호의 발행을 기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간절하다.
내가 좋아하니 남들도 그러려니 하는 나의 생각은 지난날 투고한 글에 대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필자는 왜정시대의 삶, 해방의 기쁨, 한반도 분단의 슬픔, 6·25의 비참한 민족 상잔 그리고 막연한 통일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글을 투고해 왔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을 앞세워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지 못한 세대들에게 지난날의 희비극을 알려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하여 부질없는 경험과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가슴의 상처를 그 계절에 맞춰 가끔 투고한 것이 20여 회.
두서 없이 적은 원고가 신문에 인쇄되어 나올 때의 느낌은 또 다른 글을 준비하는 자양분이 된다.
인쇄된 필자의 글은 틀린 철자법이 고쳐져 있고 문장 역시 독자의 구미에 맞도록 비교적 알맞는 표현으로 다듬어져 있어 되살펴 읽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었다.
얼마전 한국 방문시 최근 필자가 투고했던 기사들이 실린 <코리안위클리>를 가지고 가 한국 최고의 권위 있는 월간지 편집장을 지낸 죽마고우에게 필자의 원고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적이 있다.
‘너 이거 어디서 컨닝했냐’라는 친구의 첫마디 말에 ‘야 학교시절에 네 시험지나 컨닝했지...’라고 농담 섞인 말로 응대할 정도로 친구와는 막역한 사이다.
<코리안위클리>에 대해 손색 없는 주간지라고 칭찬하며 발행인을 묻는 그의 표정에는 직업 의식 근성이 역력해 보였는데 필자에게 50여 회 이상 투고를 매듭짓고 이곳 영국 한인사회를 위하여 단행본을 구상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친구의 권유대로 하려면 앞으로 30회를 더 투고해야 하는데 나로서는 우선 <코리안위클리>가 내 글을 얼마나 채택하여 줄 지가 더 걱정이다.
다만 6·25를 목견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지난날의 기구하고 찌들린 굶주림, 고생했던 역사적 고통을 알려주고 어려운 시절의 국운과 지금의 잘사는 나라와 어깨를 겨누려는 분에 넘치는 표상을 충고하며 영국 내에 교포생활과 한인사회의 격동 등의 일화에 산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면 누가 감당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닌데 벅차기만 하다.
이런 의무감을 생각하면 앞으로 기왕 인연이 된 <코리안위클리>를 통하여 괜히 안달하는 마음을 알리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다. 무엇보다도 나의 남은 과제를 위하여 그리고 한인사회 언론매체의 발전을 위하여 600호를 무난히 돌파한 이 주간지에 긴 역사가 이어지도록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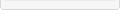




 의견목록 [의견수 : 0]
의견목록 [의견수 : 0]


















